[신문로] 트럼프가 되살린 유러피언 드림
2012년 시진핑이 나타나 중국몽을 주장하기 훨씬 전인 2004년 유럽의 꿈이 세계적으로 회자된 적이 있다. 미국의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미국 모델보다 사회적 배려를 담고 합의를 추구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럽의 모델이 21세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경제 모델이 다르다는 사실은 20세기부터 상식이었다. 미국은 소위 ‘야만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혹독한 사회였다면 유럽은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독일)나 혼합경제(프랑스)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21세기가 시작되던 당시 유럽은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경제 수준이었고, 따라서 유러피언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과 경쟁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당시는 미국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고,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군사적 하드 파워를 자랑하는 시기였다. 반면 유럽은 1999년 유로라는 초국적 단일화폐를 출범시키고 공산권에서 탈피한 중·동유럽 국가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상황이었다. 호전적 미국과 포용적 유럽이 대비되는 시국이었던 셈이다.
아메리칸 드림과 중국몽에 밀린 유럽
20여년 뒤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미국과 경쟁하는 세력은 중국이지 유럽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어깨를 겨누고, 기술과 산업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은 중국이다. AI 분야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아메리칸 드림과 중국몽이 대결하는 세계 질서에서 유럽은 이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군사적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나 독일 1인당 국민소득은 5만~6만달러지만 미국은 8만~9만달러 수준이다. 유러피언 드림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모양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럽의 꿈을 되살리고 있다.
구조적으로 유럽이 변한 건 없다. 어차피 유럽의 특징은 변화하지 않거나 아주 느리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이 등장해 국내외 질서를 마구 흔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유럽 사회 모델의 장점이 드러나게 되었을 뿐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자 학자 헨리 키신저는 위기가 발생해 유럽이 필요해도 누구에게 전화를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키신저의 발언은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 또는 분산된 권력 구조를 꼬집을 때마다 등장하는 비난이 되었다.
반면 요즘 손바닥 뒤집듯 제멋대로 미국 관세 정책을 갖고 노는 막강한 책임자 트럼프를 보면 오히려 책임이 분산된 유럽연합이 낫다는 생각이 들만하다. 일례로 유럽의 관세 정책은 27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길고 복잡한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어렵다.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린란드나 파나마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는 위협이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 마땅하다는 협박은 아메리칸 꿈이 실제는 악몽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반대로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국제 공동체다. 몇 년전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겠다는 움직임이 러시아 침공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을 정도다.
유럽은 통계상 미국보다 가난하더라도 삶의 질만큼은 명확하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대다수 유럽인은 여전히 8월 한달을 휴가로 보내며 아이들 대학 보내는 돈 걱정이나 병원비 걱정은 미국인들보다 덜하다. 무엇보다 유럽인의 평균 수명은 미국인보다 더 길고 유럽 어린이들은 학교 가서 총기 난사를 피하는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
유럽을 다시 위대해 보이게 만든 트럼프 정책
트럼프가 지난 두달 동안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을 다시 위대해 보이게 만든 일이다. 적어도 치열한 경쟁 사회 미국의 혁신 경제가 느려터진 안정 사회 유럽의 규제 경제보다 반드시 낫지는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동시에 매우 ‘효율’적인 트럼프의 미국 정치가 분산된 ‘무기력’의 유럽 정치보다 그리 탁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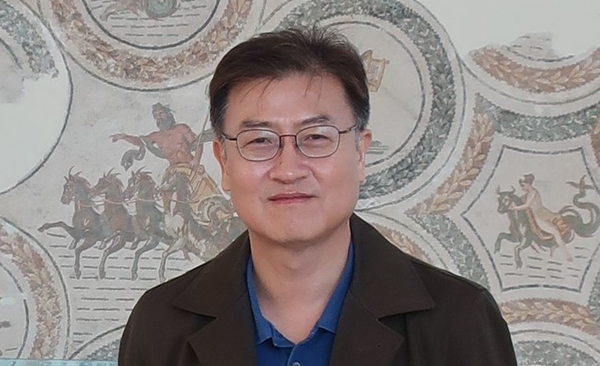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